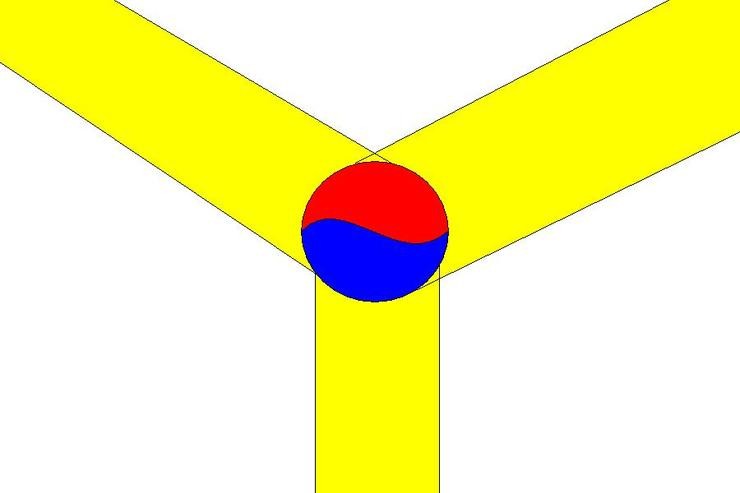2024. 4. 4. 07:37ㆍ소설 모음
삼남매를 두고 떠나온 집, 그리고 그리움
1986년 3월 22일, 고 씨는 밤에 몰래 집을 나왔다. 잠들어있는 삼남매를 내버려둔 채.
당시 아홉 살이었던 큰딸만 잠결에 어렴풋이 기억하는 장면이었기에,
몇 살 터울의 동생들은 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도 보지 못했다. 집을 떠나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.
하지만 고 씨는 더 이상 버틸 자신도 없었다. 술만 마셨다 하면 손찌검이나 해대는 남편.
그런데 임신 중인데도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. - 그게 최악의 불효이다. -
게다가 걸핏하면 돈 달라고 악을 쓰면서 집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마저 몰래 가져갔다.
‘이대로 있다간 죽는다.’
고 씨는 살고 싶었다. 언젠가 돈을 모아 아이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. 서울로 떠나온 고 씨는 악착같이 살았다.
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.
어느덧 1990년 11월 2일, 시누이인 아이들의 고모가 삼남매를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다.
생계에 지친 고 씨가 삼남매를 만나고 싶어 전화했더니 시누이는 단칼에 자르고는 전화를 끊었다.
“애들이 엄마 안 만나고 싶대.”
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을 떠나온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고 씨는
아이들을 만날 때까지 시누이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다. 3남매 모두 고아원에 맡겨진 것도 몰랐다. 2001년 군포시.
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끼며 모으고 살았던 고 씨는 작은 칼국수 식당을 열었다. 가족을 떠나온 지 15년 만이었다.
테이블 몇 개뿐인 작은 칼국수 집이었지만 고 씨는 큰 보람을 느꼈다.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.
매일 새벽에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와 음식을 만들었다.
손맛이 좋고 정성껏 대접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늘었다.
자정 넘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고 씨는 씩씩하게 국수집을 꾸려갔다.
아이들과 상봉한 순간까지도 20년 가까이 국수집을 운영했던 고 씨.
주변에서 여러 가게가 생기고 사라진 중에도 고 씨의 국수집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.
동네 상인과 주민들은 고 씨를 ‘터줏대감’이라고 불렀다. 하지만 고 씨는 가끔씩 얼굴에 걱정이 더해졌다.
헤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였다.
“삼남매가 멀리 경상남도에서 시누이와 살고 있다고만 들었어요.
돈이라도 좀 부쳐주고 싶은데, 그걸 전달할 방법도 없네요.”
고 씨는 아이들 생각이 날 때마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리움을 억지로 삼켰다.
2019년 4월부터, 고현영 씨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. 이상하게 발이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.
심부전증에 고혈압 증세까지 온 고 씨는 그 후에는 약을 달고 살았다. 이듬해엔 더 큰 난관이 닥쳤다.
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 씨는 몇 달 간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.
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는 쌓이고 병원비 부담도 커져만 갔다.
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국수집에 나갔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.
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. 그때는 아이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곤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.
그 와중에도 집 앞 화단에서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운 식물이 있었는데,
아이들과 상봉한 뒤로는 아이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생을 편안히 보냈다.